이름이 없어도 … 구별할 수 있다면 아름답다
122
신경준의 고전수필 속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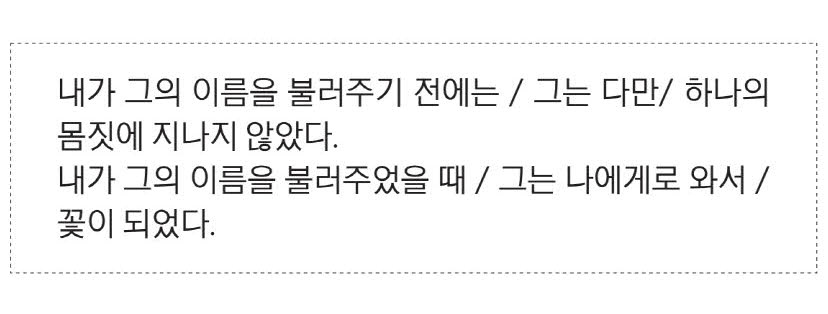
김춘수 작가의 현대시 '꽃'의 서두이다. 이 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현대시를 뽑을 때 빠지지 않고 선정되는 작품 중 하나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자 비로소 '꽃'이 된다는 생각을 통해 이름이 대상과 얼마나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또한 대상을 무심코 '야' 혹은 '너'라고 부른 적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반성하게 되는 시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申景濬)이 남긴 고전수필의 서두이다. 순원(淳園)은 순창 지역에 있는 정원으로, 작가는 정원의 '꽃' 이야기를 꺼내며 '이름'에 관한 생각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작가의 생각은 앞서 살펴본 현대시 '꽃'의 관점과는 판이하다.

작가는 '대상'과 '대상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분리한다. 사람들이 사물을 좋아할 때는 사물의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너머'의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즉 대상의 진정한 본질은 '이름 너머'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작가의 이러한 생각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작가는 '이름'에 관해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의 논리에 따라 글의 흐름을 쫓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작가의 생각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틀렸다고 하긴 어려운 것이다. 이름이 본래 '구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별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단어들이 모두 '이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름이 없다는 뜻의 '무명(無名)'도 대상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면 이름이 아닌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작가는 이름을 아름답게 짓거나 치장하는 것을 싫어한다. 구별의 기능만 가진다면 모든 말이 이름이 될 수 있기에 이름을 꼭 공들여 짓거나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작가는 이름뿐 아니라 무언가를 과하게 꾸미거나 치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양이다.

작가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 이 글을 이해하는 핵심은 작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를 고민해 보는 것이다. '이름'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보통인데 작가는 왜 그 반대의 생각을 지니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그가 살았던 시기와 업적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작가 신경준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 현대의 직업군으로 그를 규정하면 지리학자에 해당한다. 그의 저서 '산경표' '동국여지도' '팔도지도' 등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는 당시 풍수라고 불리던 분야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평을 받는 학자다. 그가 남긴 저서 '산경표'는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산맥을 정리한 것인데 이 책은 글로 내용을 설명한 지리서가 아니라 가로로 칸을 구분하고 세로에는 산 이름과 관련 사항을 기록한 형식의 표이다. 일종의 산맥 족보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나라 산맥의 모양과 정보를 기록한 책이다. 작가가 상당히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관점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작가 신경준은 실용주의와 맞닿아 있는 실학자의 면모를 강하게 지녔던 인물이다.
이렇듯 작가가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한 학자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글이 전달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글에서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아마도 '형식'이나 '명분'일 것이다. 작가는 '이름' 이야기를 통해 당시 세태를 꼬집어 지적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 작가는 당시 허울뿐인 명분이 실체를 가리는 상황을 지적하고 싶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 정치는 혼란의 연속이었고, 그 주된 원인은 형식이 본질과 실체를 가리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허례허식으로 가득한 정치가들이 실속 없는 논쟁을 거듭하다 정쟁(政爭)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았다. 작가는 이러한 당시 사회의 모습에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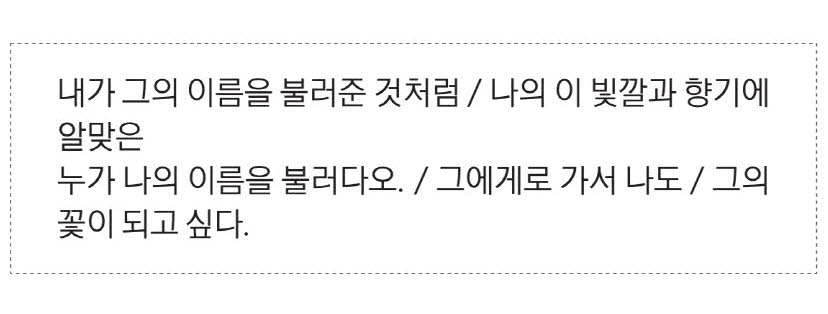
다시 김춘수의 '꽃'이다. 실학자 신경준의 생각과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졌지만 천천히 새겨보면 결국 두 작가의 생각은 같은 맥락이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이라는 구절에 주목해보면 대상의 이름은 그것의 특징에 꼭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실상부(名實相符)'라는 말이 있다. '이름'은 대상의 성질이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름은 화려하고 번드레하게 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의 성질과 실체에 부합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이나 사물 혹은 사건에 '이름을 지어 붙이는 것'을 '명명(命名)'이라고 한다. 명명은 참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이름은 대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한번 정해진 이름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조들이 남긴 글을 통해 이름만 화려하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와 대상에 맞게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